| extra_vars1 | 신통방통 용녀보살 |
|---|---|
| extra_vars2 | 6 |
| extra_vars3 | 1321-5 |
| extra_vars4 | 2 |
| extra_vars5 | 1 |
| extra_vars6 | 1 |
| extra_vars7 | |
| extra_vars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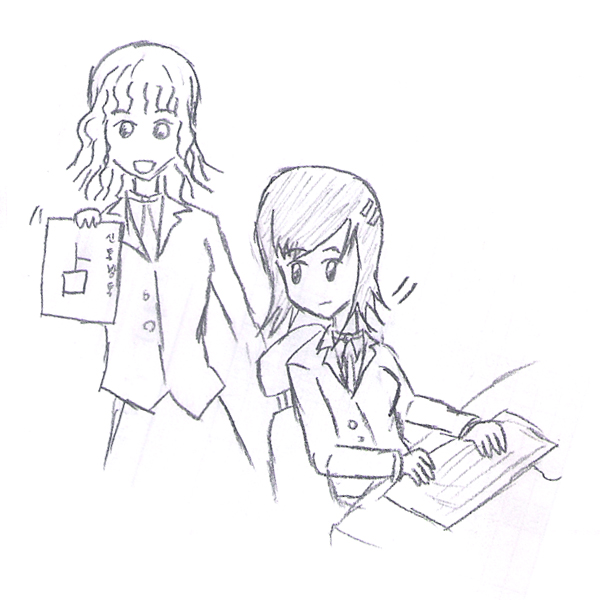
"말숙아, 있잖아, 아주 용한 점집이 있던데...한번 가 보지 않을래?"
기획안을 짜내느라고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는 말숙이 옆에 은근슬쩍 자판기에서 뽑아온 커피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을 거는 한 직장 여성이 말숙이에게 접근했다.
말숙이는 자판을 두들기다 말고 옆을 돌아보았다.
"신미씨, 그런거 난 안믿어. 믿을 게 못된다고."
"있어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껄. 정말 족집게 처럼 딱 딱 맞다니깐. 정말 신기해. 얘, 얘, 일단은 한번 만나 보고 나서 그런 소리나 해."
그리고는 꼭 같이 가줘야 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 차마 똑바로 쳐다 볼 수 없을 그런 눈빛이였다.
"그러지 말고 한번만 같이 가 보자, 응?"
"....알았어. 시간 낭비일것 같지만 그렇게 애원하는데 할 수 없지."
말숙이는 못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근하는 길에 같이 가는거다. 알았지?"
신미는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화장실.
케텔은 말숙이에게 문득 물었다.
"인간들은 점 같은거에 관심이 있는 거냥?"
말숙이는 케텔에게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 그래서 점쟁이나 그런 미신 같은거에 의지하고 그런 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한심한 인간들이야."
그리고는 계속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마스카라를 올렸다.

그러더니 말숙이는 문득 뭔가가 생각난 듯이 케텔에게 물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사신은 미래가 궁금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을까?"
케텔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음....아마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신은 없을거다냥."
"그건 왜지?"
케텔이 대답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냥.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고, 가끔 다른 사신과 도박이나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내고 있다냥. 미래라고 해야 현재와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일 따름이다냥."
그러더니 이어서 말했다.
"그런 지루한 일상은 지겨웠다냥. 그래서...."
"...데스노트를 인간계에 떨어트린 거지? 완전 류크랑 똑같네."
번화한 거리를 지나 어느 덧 골목길로 접어 들었다.
"이쪽이야. 이쪽."
신미는 말숙이의 손목을 붙잡고 골목길 속으로 이끌어갔다.
말숙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 가득찬 요란한 간판들, [천나장군 천나비], [타로 랜드], [신비의 청돌점], [로또 1등번호 맞춘 집], [노스트라나무스가 환생한 IQ 870의 천재 에언가], [외계의 메세지를 전하는 곳] 등등.......대략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였다.
문득 신미는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야."
말숙이가 고개를 들어 보니 왠 허름한 집에 허름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신통방통 용녀보살]
하지만 안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걸 봐. 이 집이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왠지 한참 기다려야 할 거 같네."
별 수 없이 신미와 말숙이는 줄 뒤에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30분이 지났다.
아직도 차례가 오려면 멀은 것 같다.
문득 지루해진 말숙이는 바로 뒤에서 줄 서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용녀보살이 그렇게 유명한 모양이죠?"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한 용녀보살님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오?"
"아, 죄송해요. 저 여기 처음 왔거든요."
"한번 만나보면 알거요. 용녀보살님은 점은 100% 맞아 떨어지시거든."
그러더니 그 사람은 이어서 계속 말했다.
"몇달 전에 말이오, 검찰 고시에 벌써 3수째 도전하는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 애는 공부는 착실히 잘하는 애인데 고시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거라. 그라서 답답한 심정에 용녀보살님을 찾아갔지. 그랬더니 용녀보살님은 고시합격 부적을 구입하면 조카가 100% 확실하게 검찰 고시에 붙을 거라고 하시더군. 그래서 부적을 샀지. 그랬더니 정말로 조카가 검찰 고시에 패스했어."
"우와, 잘됐군요. 검찰 조카를 두게 되서....."
"근데 말이지, 조카가 검찰 고시에 붙고 나서 축하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
"....저런."
말숙이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부적 얼마에 사셨어요?"
"백만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역시....뭔가 냄새가 나는데?"
드디어 말숙이 차례가 되었다.
"들어오세요."
말숙이와 신미는 허름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주역이니 토정비결이니 온갖 잡다한 책들과 벽에 덕지덕지 붙은 부적들과 수상한 그림들, 그리고 결계들이 그려져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탁자 위에 빨간 양초만이 방안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탁자 너머로 소복을 입고 눈매가 매서운 30대 정도로 보이는 신들린 듯한 표정으로 앉은 한 아줌마가 있었다.
신미가 말숙이에게 말했다.
"이 분이 용녀보살님이셔."
"아, 네......"
용녀보살은 말숙이에게 물었다.
"이름과 나이는?"
"아, 네.......신말숙 이고요. 대략 24살이요."
그러자 용녀보살은 말숙이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는 듯이 말했다.
"아니, 이럴수가!"
덩달아 신미도 자리에서 화들짝 놀랐다. 말숙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이죠?"
용녀보살은 자리에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말했다.
"놀라지 말게. 처녀. 자네는 오늘......"

"네에???"
신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용녀보살과 말숙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녀보살님!"
말숙이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다.
"죽을 살이 끼었다고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 제가 죽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네. 처녀에게는 원혼의 살이 서려 있어. 빨리 액땜을 해야 하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부적을 꺼내면서 말했다.
"살고 싶다면 이 부적을 몸에 지니게. 이것은 자네를 원혼의 살로부터 보호해 줄꺼야."
"그...그래, 말숙아. 저 부적을 사지 않으면 죽는다잖아."
유난히 빨간 글씨로 적힌 부적을 말숙이는 바라보고 있었다.
"......."
말숙이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그 부적.......백만원이죠?"
"어....그렇네. 어디서 들은 모양이군."
그러자 말숙이는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했다.

신미는 난데 없이 웃는 말숙이를 보며 당황해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말숙이는 자지러지게 웃은 다음에 눈가에 눈물을 스윽 닦아내면사 말하였다.
"웃기시네요. 애시당초 전 점 같은건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부적을 백만원에 팔아먹어서 돈을 챙기시려는 속셈이죠?"
용녀보살이 대답했다.
"믿건 안믿건 자네 마음일세. 하지만 죽은 다음에 후회해도 이미 늦는 법일세.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게."
말숙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자. 신미씨."
"말숙아, 제발 그러지 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돌아가서 용녀보살님께 사과하고 부적을......."
"아직도 그런 말을 믿는거야? 신미씨. 처음에는 그냥 말장난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이건 완전히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잖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말숙이의 손을 신미가 붙잡았다.
"내 말좀 들어! 말숙아!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그리고는 말했다.
"몇달 전에도 너 처럼 용녀보살님이 죽을 살이 끼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너 처럼 그렇게 믿지 않았지.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도사견에게 물려서 광견병으로 죽었다고!"
신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적을 샀더라면...죽지 않았을 텐데......"
다음 순간,
신미의 머리속에서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
그리고는 말숙이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바로 며칠 전에도....내가 아는 친구가 또 죽을 살이 끼었다는 소리를 들었지. 그 친구는 부적을 사는 것을 망설이면서 그냥 돌아갔지. 그래서 내가 몇달 전에 광견병으로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해 줬지. 그러자 그 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당장 부적을 사기 위해 돌아갔었지. 하지만......
용녀보살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
"너무 늦었다네. 이미 악령의 살이 뻗쳐서 손을 쓸 수 없다네. 부적을 사려면 진작에 샀어야 하는건데......."
그래서.....그 친구는 그날 밤 괴한에게 칼을 찔려서......그만........."
신미의 눈에는 어느 새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어떡해......말숙이는 이제..........죽는...거야?"

말숙이는 신미를 안으면서 말했다.
"걱정하지마. 신미. 난 죽지 않아."
"하지만....."
말숙이는 신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신미씨, 그런 점 보다도 나를 믿어. 할 수 있지?"
그리고는 말숙이는 신미를 두고 혼자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뭔가 당당해 보였다.
걸으면서 말숙이는 은근슬쩍 케텔에게 윙크를 날렸다.
"생각대로야."
그리고는 혼잣말로 말했다.
"일단은 뭔가 자료부터 찾아볼까나."
밤 12시를 조금 넘긴 한밤중 시각,
말숙이는 다시 [신통방통 용녀보살]집을 찾아갔다.
"어떻게 된 거죠? 용녀보살씨, 오늘...아니, 어제 저 한테 죽을 살이 끼었다면서요? 근데 왜 전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걸까요?"
용녀보살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말숙이에게 다시 말했다.
"으음.....이보게 처녀. 혹시 나에게 가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눈치 빠르시군요."
말숙이는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자신의 진짜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을 대면 점도 엉터리로 나오는 법이라네. 그러니까....진짜 정확한 이름을 대야 점 결과도 정확하게 나오는 법이네. 자, 진짜 이름은?"
그러자 말숙이가 대답했다.
"그걸 왜 당신에게 말해줘야 하는거죠? 그리고, 용한 점쟁이 같으면 사람 이름 정도는 말 안해도 척척 알아 맞출 수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다.
"역시나....사신의 눈이 없어서 그러는 걸 까나?"
"....무슨.....?"
다음 순간, 말숙이는 잽싸게 탁자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예상대로 데스노트의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데스노트 조각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신말숙, 점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말숙이는 데스노트 조각을 보고는 씨익 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역시 당신은 엉터리 점쟁이셨군요. 용녀보살님."
그리고는 데스노트 조각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이 점집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돈이 많을 것 같은 손님을 택한 다음, 그 손님에게 죽을 살이 끼었으니 부적을 사라는 식으로 말한 다음에 만일 그 손님이 그 백만원 짜리 부적을 사지 않을 경우, 데스노트에 그 손님의 이름을 적어서 죽이는 방식으로 비싼 부적들을 많이 팔아넘겼죠. 그런 식으로 용녀보살 당신은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데스노트 조각을 품에 넣으면서 말했다.
"신통력이 아닌 데스노트에 의지하는 점쟁이라, 진짜 최악이군요."
그리고는 또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제가 에언을 하나 하죠. 엉터리 점쟁이씨."
"?"
그러면서 말숙이는 품 속에 손을 넣고 끄적거렸다.

"!!!"
용녀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숙이에게 매달렸다.
"이....이보게! 제발 목숨만은.....!!!"
말숙이는 냉정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말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사신의 손이 뻗쳐서 손을 쓸 수 없네요. 데스노트에 한번 적힌 이름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는 씨익 웃었다.
다음날 아침.
말숙이는 화창한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말숙이의 화창한 인사에 신미는 깜짝 놀랐다.
"마....말숙아!"
말숙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신미에게 말했다.
"내가 뭐랬어. 점이니 에언이니 그런건 다 믿을 게 못된다고 했지?"
댓글 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55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8.05.08 | 771 |
| 154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8.03.14 | 914 |
| 153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8.02.28 | 856 |
| 152 |
술래잡기
[2] | 영웅왕-룬- | 2008.02.26 | 821 |
| 151 |
fate stay tragedy
[13] | 영웅왕-룬- | 2008.02.24 | 774 |
| 150 |
또 다른 키라
[3] | 책벌레공상가 | 2008.01.09 | 913 |
| 149 |
또 다른 키라
[1] | 책벌레공상가 | 2008.01.05 | 820 |
| »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8.01.01 | 750 |
| 147 |
또 다른 키라
| 책벌레공상가 | 2007.12.19 | 853 |
| 146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7.12.14 | 763 |
| 145 |
또 다른 키라
| 책벌레공상가 | 2007.12.11 | 1031 |
| 144 |
또 다른 키라
[2] | 책벌레공상가 | 2007.12.08 | 952 |
| 143 |
또 다른 키라
[3] | 책벌레공상가 | 2007.12.04 | 887 |
| 142 | MAGISTER NEGI MAGI [1] | さくらざき せつな | 2007.09.30 | 71345 |
| 141 | 왜곡 [2] | 영웅왕-룬- | 2007.09.09 | 932 |
| 140 |
템페스트 픽션
| 책벌레공상가 | 2007.08.06 | 1023 |
| 139 | [FATEX에반게리온]헤라클레스의 랩소디 | 나린 | 2007.07.20 | 958 |
| 138 | [피터/릴리]달맞이꽃(해리포터 팬픽) [4] | ∑물망초ːぁぃ | 2007.06.15 | 1212 |
| 137 | [강철의 연금술사X제로의 사역마] 사역마가 연금술사?! [1] | 나린 | 2007.05.28 | 993 |
| 136 | [강철의 연금술사X제로의 사역마] 사역마가 연금술사?! [2] | 나린 | 2007.05.24 | 1050 |



역시 재미있어요 ㅎ|+rp2+|16588|+rp3+|fiction_yeonjea